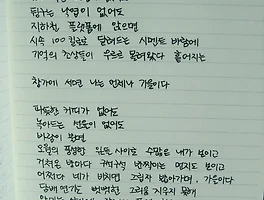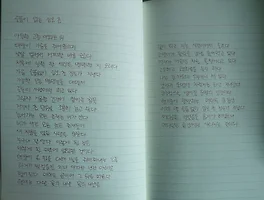|
어내느라 소모된 시간들, 나는 비로소 문장 속으로 스 며서, 이 골목 저 골목을 흡흡, 냄새 맡고 때론 휘젓 고 다니며, 만져보고 안아보았다. 지루했지만 살을 핥 는 문장들, 군데군데 마지막이라 믿었던 시작들, 전부 가 중간 없는 시작과 마지막의 고리 같았다. 길을 잃 을 때까지 돌아다니도록 배려된 시간이, 너무 많았다, 자라나는 욕망을 죄는 압박붕대가 너무, 헐거웠다, 그 러나 이상하다, 너를 버리고 돌아와 나는 쓰고 있다, 손이 쉽고 머리가 맑다, 첫 페이지를 열 때 예감했던 두꺼운 책에 대한 무거움들, 딱딱한 뒷표지를 덮고 나 니 증발되고 있다, 숙면에서 깬 듯 육체가 개운하다, 이상하다, 내가 가벼울 수 있을까, 무겁고 질긴 문장 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 김소연 시집 <극에 달하다> 중에서 |
구슬 두 자루. 색이 다른 구슬 천개쯤 꿰어야 한다. 구슬자루가 무거워서 일단 들여다 놓고 한숨부터 돌린다. 아름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여 한참 들여다보다가 일단 꿰기 시작한다. 칠백 오십 개쯤 꿰다가 끈을 놓쳐버리고 팔백구십 삼개에서 또 놓쳐버리고. 밥 먹고 꿰고 커피 마시고 꿰고 음악 듣다가 꿰고 방 쓸다가 꿰고 자다가 꿰고 꿈에서도 꿰고. 넌더리가 나서 윗목에 밀어놨다가 꿰고. 꼬박 며칠을 보내야 겨우 만들어지는 것. 글 쓰는 일이 그렇게 지루하고 아득할 때가 있다. 한 자루는 가까스로 꿰었는데 또 다른 한 자루가 남았다. 막막할 때는 글을 써야만 두려움이 사라지니 딴 짓을 오래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도 배회한다. 길을 잃어버리려고 일부러. 무겁고 질긴 문장들이 가벼워지고 내가 쓴 글을 내가 비로소 이해할 때라야 끝이 난다. 쓰고 난 후의 일독. 횡단보도의 빗금처럼 분할된 문단을 보는 것. 그 선명한 물질감이 위안이다.
근로기준법에 월 1회 생리휴가가 있는 것처럼 나도 한 달에 딱 하루 동안 삶에서 증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난 금요일엔 새벽부터 소풍가는 꽃수레 김밥 싸고, 아침에 위클리 편집회의, 오후 2시에 수녀님들과 회의. 기운이 없었다. 시내를 나가면서 머리도 안 감고 까마귀처럼 온통 까맣게 뒤집어쓰고 나갔다. 아무데나 눕고 싶었다. 내가 따르는 이모 같은 수녀님이 날 보고는 아이엄마인데도 흐트러짐 없이 다녀서 좋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신다. 글쎄 말이에요. 그랬다. 사는 게 자신 없던 적은 더러 있는데 귀찮기는 오랜만이다. 어쩌자고 자식은 둘이나 낳아가지고 간신히 밥만 해먹이면서도 그게 꾀가 난다. 심지어 억울하기도 하다. 나 밥하려고 태어난거 아니거든. 글 쓰는 일을 좋아하는데 흘러가는 감정을 사진처럼 찍어서 같이 나눠보고 그러는 낙으로 살았는데 그것도 어설프고. 나한텐 글이 진심을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인데 그마저 서투르다. 미궁이다. 사는 동안 이럴 것 같다. 요새 김연우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를 귀에 달고 살았더니 그 대사가 입속에 혀처럼 감기더니 이렇게 됐다. '살아가는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드네'
'올드걸의시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죽은 가난한 사람에게 / 파블로네루다 (14) | 2010.11.25 |
|---|---|
| 우리 동네 구자명씨 / 고정희 (2) | 2010.11.22 |
| 내 속의 가을 / 최영미 (4) | 2010.10.16 |
| 심보선 / 슬픔이 없는 십오초 (8) | 2010.10.05 |
| 익숙해진다는 것 / 고운기 (4) | 2010.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