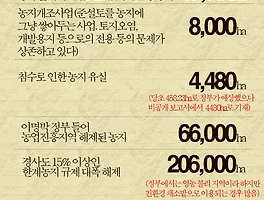“지난번에도 깎았잖아요.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올 때마다 무조건 깎아달라고 하면 어쩌라고. 나는 뭐가 남느냐고오. 아, 진짜 너무하시네.”
왁자지껄한 시장 통 사이로 우렁찬 사내의 목소리가 파고든다. 가격을 흥정하는 모양이다. 구구절절 하소연이 통했는가. 상대방은 말이 없다. 소낙비처럼 지나가는 시원한 일갈에 주변에 선선한 웃음이 번진다. 요즘은 어딜 가나 ‘고객님~’ 소리가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재생된다. 안하무인 고객도 왕으로 모셔야한다. 친절만 있고 인정이 없는 차가운 세태에 비하면 여기는 후끈하다. 소박하고 거칠지만 옥신각신 사람 사는 맛이 살아 있다. 세월이 저만치 비껴간 곳, 성남 모란시장 5일장 풍경이다.
“옛날에는 여기가 개천이었어. 복개공사 하기 전에는 대로변에 좌판을 벌렸지. 완전 옛날 재래 풍물시장이지. 대상인들이 많고 없는 거 없기로 유명하고, 여기에 성남시외버스터미널이 있을 때는 전국에서 다 왔어. 요즘에도 인천, 수원, 안산 근처에서 많이 와요.”
20년 째 모란시장에서 견과류를 팔고 있는 장성아(59)씨. 해바라기씨, 호박씨, 호두, 잣, 땅콩 등등 군침 도는 고단백 영양 간식이 자루마다 푸짐하다. 그것들이 오밀조밀 얼굴을 내밀고 고소한 냄새를 피워 오가는 발걸음을 불러 세운다. 주인아주머니는 값만 물어봐도 “맛 보시라”며 갓 볶은 땅콩을 한 움큼 퍼서 쥐어준다. 후덕한 인심에 반해 한 됫박씩 사가는 단골도 많지만 아무 기척 없이 퍼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아휴, 그러면 꼬라지나 죽겄어. 호두 같은 건 알도 굵고 얼마나 비싼데 그걸 하나도 아니고 한 주먹이나 가져가면 애타지. 그래도 어떡해.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사러 오겠지 하고 참아야지. 오래 됐다고 단골이 많은 게 아니야. 일단 맛있고, 많이 주고. 장사는 인색스럽지가 않아야지.”
아침 5시 10분에 집에서 나와 밤 9시나 돼야 판을 접는다는 장성아 씨.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묻자 ‘생로병사의 비밀’이 담긴 답변이 돌아온다. “집에 있으면 몸이 아픈데 나오면 몸이 안 아파.”
모란장은 1964년에 최초로 형성됐다. 4일, 9일마다 열리는 재래시장이다. ‘모란’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구슬프다. 1964년 모란민속장 형성에 공헌한 김창숙씨가 1.4후퇴 때 평양 모란봉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정했다고 전해진다. 북녘 땅 모란봉은 산의 생김새가 마치 모란꽃 같다 하여 모란봉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모란시장은 엄마품처럼 푸근하고 온갖 생명이 자라는 산처럼 풍요롭다. 4,300여 평 규모로 시골초등학교 운동장 두 배 규모는 됨직하다. 꽃, 잡곡, 약초, 의류, 애견, 이불, 음식, 생선, 생활 잡화 등 손자용부터 할머니용까지 만물박람회장이다. 한 때는 장날이면 모란역에 노인들의 전철표가 3만장이 쌓인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였다. 여전히 남녀노소 찾는 이들이 많다.
안선자(32)씨는 조카와 함께 모란시장엘 들렀다. 얼굴에 장난기가 흐르는 남자아이는 설탕이 잔뜩 묻은 뜨끈한 꽈배기 도넛을 까만 봉지 채 들고 먹고 있고, 여동생은 알록달록 액세서리 코너에서 머리핀을 고르느라 여념 없다. “이 근처에 사는데 모란시장이 있다는 말만 듣고 한 번도 못 와 보다가 오늘 처음 왔어요. 생각보다 크고 물건이 싸네요.” 단돈 천원에 곰돌이 방울 한 쌍을 손에 쥔 이모와 조카는 흡족한 표정으로 종종 걸음을 옮겼다.
야생의 초원처럼 길게 뻗은 시장 길. 좌로 우로 둘러보다 보면 걸음이 느려진다. 느릿느릿 그리고 기웃기웃 몸을 기울일수록 싸고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다. 닮은 듯 조금씩 다른 가게들은 주인장의 표정과 말투가 ‘그 때 그 가게’임을 알려주는 간판이다.
여성의류를 취급하는 한옥화(62세)씨. 한 자리에서 30년째다. 초기엔 양말을 팔다가 의류로 업종을 변경했다. 까만색 레이스 카디건, 파랗고 빨간 꽃무늬 블라우스, 호피무늬 셔츠가 옷걸이에 매달렸다. 만산홍엽 물든 가을산이 따로 없다. 주요 고객은 중장년층 여성이다. “어떤 옷이 어울릴지 딱 보면 안다”는 그가 옷을 권하면 손님은 손거울에 비춰보고는 지갑을 연다. 새 옷이 좋아 새색시마냥 수줍고 들뜬 얼굴로 돌아서는 단골손님은 이제 세월의 폭을 같이 한 오랜 친구 같다.
“10년 전에 남편이 먼저 갔어요. 그날로 운전면허를 땄죠. 동대문에서 물건 떼서 실어 나르고 천막 치고 좌판 펴고, 혼자서 다 해요.” 딸 여섯을 키웠고 손자손녀가 다섯이다. 예전엔 힘쓰는 일을 전혀 못했는데 이제는 일사천리다. 그가 터놓는 시장사람으로 사는 법은 또 이렇다. “애들을 많이 낳다보니까 저절로 힘이 생겼어요.”
시장사람들이 다들 억척스럽게 산다고 한옥화 씨는 덧붙였다. 커튼 가게 최기수(75)씨도 30년 동안 모란장에서 오남매를 길러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라던 시인의 노래대로 그들은 오늘도 모란장을 지킨다. “구경은 공짜니께 월매든지 허셔~” 흥겨운 추임새를 넣으며 찬란한 생의 봄날을 기다린다.
* 야곱의 우물 2010. 10월호.
'사람사는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절두산 부활의 집 - 13월의 풍경 (12) | 2010.10.23 |
|---|---|
| 행복전도사 그 쓸쓸함에 대하여 (12) | 2010.10.09 |
| 2010년 목동의 3대세습 풍경 (10) | 2010.10.02 |
| 채소값 폭등의 진실 (10) | 2010.09.28 |
| 철학에의 권리, 국제철학학교 다큐멘터리 (6) | 2010.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