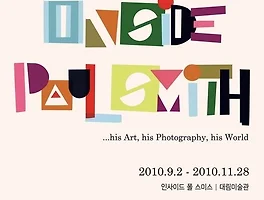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생선 굽고 찌개 데우고 아들을 깨운다. 딸내미는 나랑 같이 자니까 내가 부시럭대면 같이 일어난다. 아들아, 학교 가야지. 그럼 아들은 이불속에서 꿈틀거리며 묻는다. 엄마, 아침 뭐에요. 기가 딱 막힌다. 전표에 주문이라도 받아야하나 싶다. 밥이지 뭐야(이놈아). 기분 좋은 날은 그냥 넘어가고 피곤한 날은 쏘아붙인다. 아들은 억울한 목소리로 그냥 물어보는 거에요. 아무거나 줘도 괜찮아요. 그런다. 주는대로 먹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왜 아침마다 물어보느냐고 또 따진다. 아침엔 티격태격 오후엔 살랑살랑. 저번엔 야채랑 고기 넣어서 샌드위치를 정성스레 만들어주었다. 맛있게 먹는 아들이 귀여워서 그걸 못참고 한마디 했다. 아들아, 엄마가 온갖 정성 다해서 세끼 밥 먹이고 고급간식까지 챙겨서 키운 걸 잊으면 안 된다. 외할머니처럼 엉덩이까지 두드린다. 아들이 알았어요. 한다. 진짜 알까. 내가 꼭 조선시대 여인같다.

애들 둘 학교 가고, 폭격맞은 마을처럼 어질러진 집안을 치운다. 이불 개키고 책상 밑에 양말 꺼내서 세탁기에 넣고 책상위에 휴지 치우고 쓸고 닦고. 좁은 방 두개랑 마루까지 하면 쓰레받이에 머리카락과 먼지가 한가득 모인다. 내 마음의 번뇌와 소란이 딱 그만큼 물질화된다. 한숨처럼 시커멓고 뒤엉켰다. 설겆이 하면서 접시와 컵과 냄비로 탑을 쌓는다. 네 식구 먹은 아침설겆이가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 매번 놀랍다. 커피 내리고 그리고 나면 두어시간이 후딱 지나간다. 정확히 9시. 빨래 돌린 날은 9시 반. 왠지 허탈하다.그때부터 책좀 보거나 글을 쓰거나 해야하는데 금방 시동이 걸리진 않는다. 거듭되는 일상. 사는 동안 이런 생활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삶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 삶은 위대해야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추구하는 가치 고귀해야하는 거잖아!
나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시계초침처럼 척척 돌아가는 인생이 낯설다. 뭔가 이루지 않는 삶은 무가치한 것은 아닐진대 이대로 해가 질까봐 아깝기도 하다. 내 청춘 저무나. 나에게 꿈이란 게 있었나. 없었고 없고 싶다.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꿈까지 있으면 깔려죽을 것 같다. 이럴 땐 엄마란 굴레가 도피처다. 게으름에 관한 면죄부. 엄마 해먹기도 힘든데 일과 공부야 대충 타협해도 누가 뭐래나. 그러니 내가 가사노동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비겁한 선택일지도 모르겠다. 일에 올인할 용기가 없으니까 엄마노릇에서 무게비중을 거두지 않는 거다. 그렇다고 미련이 가시나. 아니다. '엄마'라는 역할놀이에만 머물기엔 '존재감'이 충족되지 않아 목침 두께용 책들을 잔뜩 쌓아두고 쩔쩔 매고 월수목 밤마다 하품해가며 공부하러 밤마실을 나간다.
참으로 성과없이 요란하다. 돈도 못벌고 꿈도 없는 워킹맘 신세라니. 남편은 당신처럼 바쁜 여자가 어딨냐고 그러는데 요즘은 돈도 못 버니까 눈치가 보인다. 일찍 오라고 말하기도 미안하다. 훌쩍 커버린 아들이 엄마도 책 하나 쓰셔야죠 그러면 유구무언이다. 딸내미는 담임선생님이 엄마가 무슨 작가냐고 물어봤다고 뭐라고 하냐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 날 쳐다볼 땐 책상 밑에 숨고 싶었다. 조기결혼이 문제였을까. 엄마로 태어난 게 죄일까. 자식이 하나였으면 좀더 나을까. 인생이란 책에서 일부분만 찢어낼 수있다면 난 어느 시기를 흔쾌히 들어낼수 있을까. 아무리 궁리해도 통째로 불사르지 않으면 그럴 순 없을 거 같다. 다 촘촘히 연결돼 있다. 자식이 있어서 괴로웠던만큼 꼭 그만큼 난 수행했다. 타자체험을 아주 격하게 했고, 꼭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둥글어졌다. 득과 실의 공존일까. 이런 교과서적인 결론을 피해갈 수 없어서 서글프다. 삶의 아이러니를 수용하는 것이 인생이라 해도.
내가 애들을 냅두고 오피스텔에서 일하는 엄마일 수 있을까. 애들은 어차피 외로움과 컵라면에 길들여질 텐데 내가 그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엄마'의 직권으로. 삶의 판이 그렇게 짜여졌다. 나의 신체가 가족내 역할에 길들여졌다. 지난토요일에 아버지 생신에 친척들을 만났는데 작은엄마 큰엄마 고모들은 나만보면 착하다고 그런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순둥이라고.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니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그래도 다행이라고 그런다. 몹시 신경질 난다. 욕같다. 그 착하다는 얘기 듣기까지 비탄의 강물에서 허우적댄 걸 자기들이 알기나 하는지. 제2의 천성처럼 피부에 들러붙은 도덕과 사회규범의 잣대를 비웃고서 미친년처럼 내멋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한이 될 거 같다. 다음세상에 태어나면 착한 딸도 됐고 조선시대 엄마노릇도 됐거든이다. 이걸 까먹지 말아야할 텐데. 전생의 기억을 갖고 태어나야할 텐데.

나비처럼 살고 싶지만 소처럼 살고 있는 나에게 누가 영화를 권해줬다. "니가 생각났다"고. 영화에는 교사하다가 퇴직금 갖고 영화 만드는 서른아홉 엄마와 열다섯 아들이 나온다. 정말로 나랑 나이가 같고 팔둑 굵은 게 같다. -.-; 육체적 조건의 일치. 엄마는 영화감독이 꿈이고,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은 특권이라고 대드는 아들은 뮤지션 지망생이다. 제목이 <레인보우> 한예종 영상원 출신 감독이 자전적 얘기를 풀어낸 영화다. 별 얘기도 없는 평이한 스토리인데 웃기고 재밌다. 이야기 이음새가 탄탄하다. 행복을 꿈꾸는 자는 삶에 대한 욕망이 삶에 대한 복수로 전환되기 일쑤다. 주인공 지완은 행복엔 관심없어 보인다. 오직 영화감독을 꿈꾼다. 그리고 설겆이감 잔뜩 쌓인 남루한 일상에서 해낸다. 불꽃같은 열정이 아닌 뭉근한 끈기로. 박수쳐줄 일일거늘,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났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영화를 보는 일이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는 노동이 됐다. 외로운 감정노동. 희망참보단 쓸쓸함을 안겨준다. 너도 나도 꿈을 이뤄가는데 나만 꿈에서 멀어지는 건가 싶으니. 광석이형 말마따나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애들 둘 학교 가고, 폭격맞은 마을처럼 어질러진 집안을 치운다. 이불 개키고 책상 밑에 양말 꺼내서 세탁기에 넣고 책상위에 휴지 치우고 쓸고 닦고. 좁은 방 두개랑 마루까지 하면 쓰레받이에 머리카락과 먼지가 한가득 모인다. 내 마음의 번뇌와 소란이 딱 그만큼 물질화된다. 한숨처럼 시커멓고 뒤엉켰다. 설겆이 하면서 접시와 컵과 냄비로 탑을 쌓는다. 네 식구 먹은 아침설겆이가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 매번 놀랍다. 커피 내리고 그리고 나면 두어시간이 후딱 지나간다. 정확히 9시. 빨래 돌린 날은 9시 반. 왠지 허탈하다.그때부터 책좀 보거나 글을 쓰거나 해야하는데 금방 시동이 걸리진 않는다. 거듭되는 일상. 사는 동안 이런 생활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삶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 삶은 위대해야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추구하는 가치 고귀해야하는 거잖아!
나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시계초침처럼 척척 돌아가는 인생이 낯설다. 뭔가 이루지 않는 삶은 무가치한 것은 아닐진대 이대로 해가 질까봐 아깝기도 하다. 내 청춘 저무나. 나에게 꿈이란 게 있었나. 없었고 없고 싶다.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꿈까지 있으면 깔려죽을 것 같다. 이럴 땐 엄마란 굴레가 도피처다. 게으름에 관한 면죄부. 엄마 해먹기도 힘든데 일과 공부야 대충 타협해도 누가 뭐래나. 그러니 내가 가사노동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비겁한 선택일지도 모르겠다. 일에 올인할 용기가 없으니까 엄마노릇에서 무게비중을 거두지 않는 거다. 그렇다고 미련이 가시나. 아니다. '엄마'라는 역할놀이에만 머물기엔 '존재감'이 충족되지 않아 목침 두께용 책들을 잔뜩 쌓아두고 쩔쩔 매고 월수목 밤마다 하품해가며 공부하러 밤마실을 나간다.
참으로 성과없이 요란하다. 돈도 못벌고 꿈도 없는 워킹맘 신세라니. 남편은 당신처럼 바쁜 여자가 어딨냐고 그러는데 요즘은 돈도 못 버니까 눈치가 보인다. 일찍 오라고 말하기도 미안하다. 훌쩍 커버린 아들이 엄마도 책 하나 쓰셔야죠 그러면 유구무언이다. 딸내미는 담임선생님이 엄마가 무슨 작가냐고 물어봤다고 뭐라고 하냐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 날 쳐다볼 땐 책상 밑에 숨고 싶었다. 조기결혼이 문제였을까. 엄마로 태어난 게 죄일까. 자식이 하나였으면 좀더 나을까. 인생이란 책에서 일부분만 찢어낼 수있다면 난 어느 시기를 흔쾌히 들어낼수 있을까. 아무리 궁리해도 통째로 불사르지 않으면 그럴 순 없을 거 같다. 다 촘촘히 연결돼 있다. 자식이 있어서 괴로웠던만큼 꼭 그만큼 난 수행했다. 타자체험을 아주 격하게 했고, 꼭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둥글어졌다. 득과 실의 공존일까. 이런 교과서적인 결론을 피해갈 수 없어서 서글프다. 삶의 아이러니를 수용하는 것이 인생이라 해도.
내가 애들을 냅두고 오피스텔에서 일하는 엄마일 수 있을까. 애들은 어차피 외로움과 컵라면에 길들여질 텐데 내가 그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엄마'의 직권으로. 삶의 판이 그렇게 짜여졌다. 나의 신체가 가족내 역할에 길들여졌다. 지난토요일에 아버지 생신에 친척들을 만났는데 작은엄마 큰엄마 고모들은 나만보면 착하다고 그런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순둥이라고.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니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그래도 다행이라고 그런다. 몹시 신경질 난다. 욕같다. 그 착하다는 얘기 듣기까지 비탄의 강물에서 허우적댄 걸 자기들이 알기나 하는지. 제2의 천성처럼 피부에 들러붙은 도덕과 사회규범의 잣대를 비웃고서 미친년처럼 내멋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한이 될 거 같다. 다음세상에 태어나면 착한 딸도 됐고 조선시대 엄마노릇도 됐거든이다. 이걸 까먹지 말아야할 텐데. 전생의 기억을 갖고 태어나야할 텐데.

나비처럼 살고 싶지만 소처럼 살고 있는 나에게 누가 영화를 권해줬다. "니가 생각났다"고. 영화에는 교사하다가 퇴직금 갖고 영화 만드는 서른아홉 엄마와 열다섯 아들이 나온다. 정말로 나랑 나이가 같고 팔둑 굵은 게 같다. -.-; 육체적 조건의 일치. 엄마는 영화감독이 꿈이고,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은 특권이라고 대드는 아들은 뮤지션 지망생이다. 제목이 <레인보우> 한예종 영상원 출신 감독이 자전적 얘기를 풀어낸 영화다. 별 얘기도 없는 평이한 스토리인데 웃기고 재밌다. 이야기 이음새가 탄탄하다. 행복을 꿈꾸는 자는 삶에 대한 욕망이 삶에 대한 복수로 전환되기 일쑤다. 주인공 지완은 행복엔 관심없어 보인다. 오직 영화감독을 꿈꾼다. 그리고 설겆이감 잔뜩 쌓인 남루한 일상에서 해낸다. 불꽃같은 열정이 아닌 뭉근한 끈기로. 박수쳐줄 일일거늘,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났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영화를 보는 일이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는 노동이 됐다. 외로운 감정노동. 희망참보단 쓸쓸함을 안겨준다. 너도 나도 꿈을 이뤄가는데 나만 꿈에서 멀어지는 건가 싶으니. 광석이형 말마따나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극장옆소극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글러브 - 울기엔 좀 미안한 청각장애인 신파극 (4) | 2011.01.19 |
|---|---|
| 클라라 - 초극의지 돋보이는 브람스의 사랑 (4) | 2010.12.08 |
| 박정훈 사진전 - 시가 흐르는 얼굴들 (7) | 2010.10.31 |
| 폴스미스 전 - 모든 것에서 영감을 받는 사람 (6) | 2010.09.23 |
| 옥희의 영화 - "홍상수 영화에 약 탔나봐" (10) | 2010.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