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는 버스를 탔다. 초봄 꽃샘바람이 사정없이 볼을 때리니 견디지 못해 올라탔다. 중간에 환승할 심산으로 옷에 붙은 바람을 털며 통로 안쪽에 자리를 잡던 중, 한 사람과 시선이 얽혔다. K? 어! 여기 웬일이냐며 우린 멋쩍은 웃음으로 상황을 눅였다. 우연한 상봉, 물러설 곳 없는 마주침, 기승전결의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어정쩡한 시공간. 이 불리한 조건의 만남이란 강제된 소개팅처럼 어색하다.
“저 이 버스 백 년 만에 탔어요.” “저도 거의 안 타는 버스인 걸요.” 어머 이럴 수가.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 영화 한 편 봤어요.” “무슨 영화요? “〈맨체스터 바이 더 씨〉.” “영화 좋나요?” “네. 초반엔 좀 졸다가 울면서 봤네요.” “어디서 오는 길이세요?” “서촌에 미팅이 있어서요.” “그랬구나. 아직 거기 살죠?” “작업실 냈어요.” “와, 번성하네요.” “간간이 소식은 듣고 있었어요. 이번에 작업한 거 좋던데요.”
K는 디자이너다. 5년 전 작은 잡지를 만들 때 같이 일했다. 편집주간까지 뭉쳐 낮밤으로 술 마시고 말을 나눴다. 흥이 잘 통했다. K는 젠틀하고 익살맞다. 엉뚱하고 단정하다. 색깔이 다른 양말을 신되 셔츠의 단추는 반드시 목 끝까지 채웠다. 남자 사람이지만 자기 얘기를 앞다투어 꺼내지 않았으며, 가만히 듣다가 한 번씩 재치 있는 대사를 쳤다. 섬세한 개인주의자인 K는 좋은 동료였다. 일하기에도 놀기에도. 가끔 보고 싶었지만 굳이 연락은 하지 않고 그리운 대로 흘려보낸 지 어언 2,3년이다.
버스에 대롱대롱 매달린 K와 나. 말의 시속이 30킬로미터를 넘지 않는 대화가 끊기다 이어지다 했다. K가 입을 뗐다. “영화 보고 나서 눈물까지 흘리셨잖아요, 조용히 감동을 안고 가야 하는데 제가 괜히 방해한 거 아니에요.” 두 눈을 껌뻑이며 미안함을 표하는 K는 여전했다. 난 손사래를 치고 고개까지 흔들었다. 선의도 호의도 없이 우린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를 탄 것뿐이다. 게다가 난 극장을 나와 카페에 들러 비엔나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는 길이었다. 영화를 음미했으니 괜찮다고 했다. K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다. 제 역할이 끝난 연극배우처럼.
이 짧은 해후가 삼삼했다. 우연히 만난 이들의 모범 답안 같은 그것. 버스 장면을 몇 번 돌려봤다. 언제 밥 한번 먹자고 말하지 않아서 좋았다. 흔해 빠진 관용구로 인연을 복제하는 건 시시하니까. 자기가 나의 고요를 침탈한 거 아니냐고 물어봐주어 고마웠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의 말씨는 다정하니까. 기억에 검은 발자국만 남기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싫음이 올라오면 곤란하니까.
예정된 후배의 결혼식에 갔다. 재작년 다른 결혼식에서 만났던 후배의 동기들 서넛이 보인다. 그중에 Y도 있다. 지난 번에 이혼 의사를 내비쳤던 Y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 궁금한데도 연락 한번 안 하는 일이 살다보니 가능해지고 있다. 어쩐지 미안해서 직접 묻지 않고 옆에 있던 C에게 넌지시 물었다. 귀에 대고 손으로 막고 소곤소곤. “Y말야, 이혼했어?” C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때 했지” 한다. 그러더니 잠시 후 저쪽에서 다가오는 Y에게 말한다. “언니가 모르고 있어서 네 소식 업데이트 해드렸다.”
순간 난 뒷담화하다가 들킨 사람 마냥 저 혼자 무안했다. Y는 결혼하든 이혼하든 슬기롭고 자유로운 주체로 살아갈 여성이지만 그렇다고 이혼이 비옷에 묻은 빗방울 털 듯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까, 말 꺼내는 자체가 아직 괴로울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결혼식장이고 난 교양인이니까 조용히 말한 건데 나 빼고 아무도 조심하지 않았다. 신여성들 사이에서 나만 동그마니 구여성이다.
그 어중간한 만남, 결혼식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나는 평소 ‘결혼은 행복, 이혼은 불행’이란 관습적 사고의 척결을 주장했다. 결혼식은 일생의 화창한 하루일 뿐 평생의 맑음을 보장하는 의례는 아니고 이혼은 비감한 일이지만 앞날의 불행을 예비하는 생의 절차는 아니다. 비 오는 날도 해 뜨는 날도 그냥 날씨인데 인간의 관점에서 좋은 날씨 궂은 날씨 구별한다는 스피노자의 말대로, 삶의 어떤 국면을 좋음과 나쁨으로 가르는 것도 지극히 관습적이고 현재중심적인 판단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결혼은 축하로 이혼은 염려로 몸이 자동 반응한 것이다. 앎은 몸을 이기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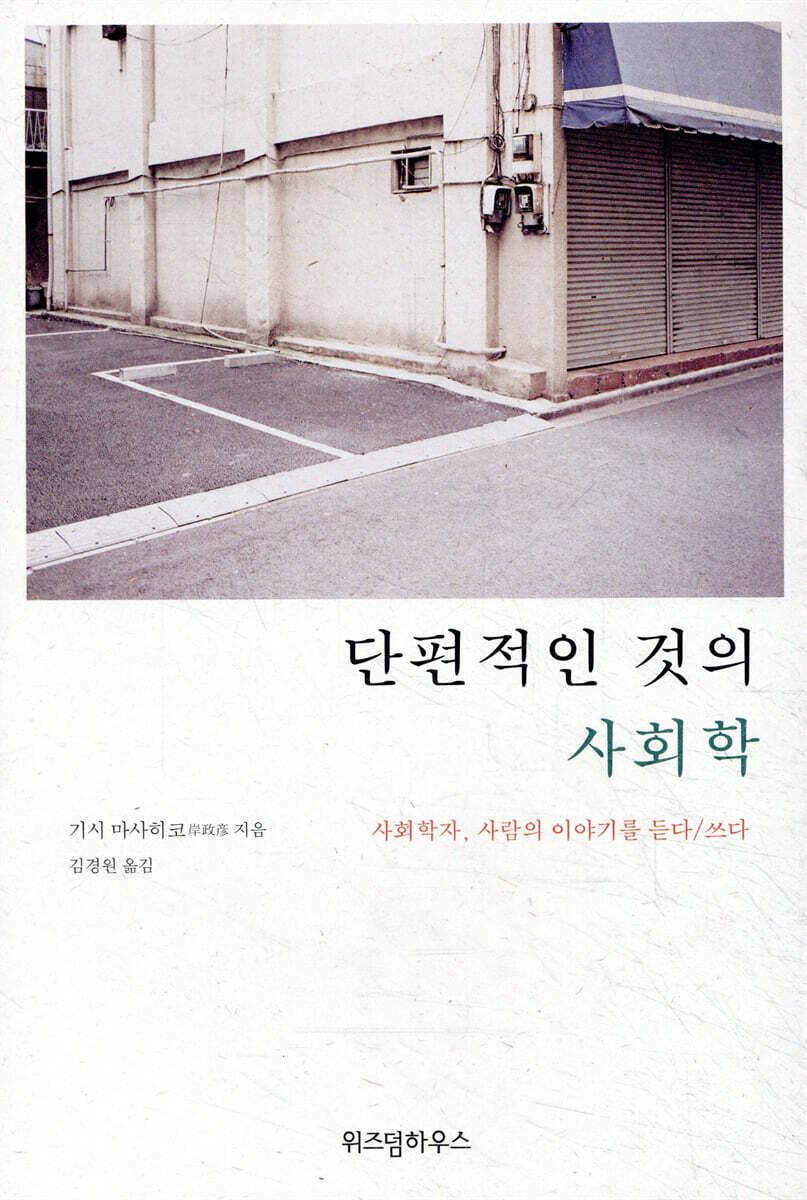 |
일본 사회학자 기시 마사히코의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에서 내 고민과 비슷한 상황이 나온다.
“우리는 좋아하는 이성과 맺어지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 그래서 축복한다. 결국 여기에는 좋아하는 이성과 맺어진 일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세상 일반에 행복한 일이라는 사고방식이 전제로 깔려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 어법, 축복의 방식은 동시에 좋아하는 이성과 맺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하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이 두 사람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의미를 필연적으로 띠고 만다.”(111쪽)
저자는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한다는 것 자체가 독신이나 동성애자에게는 저주가 된다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는 규범을 모조리 갖다 버려야 한다. 규범이란 반드시 그것에 의해 배제 당하는 사람들을 산출하기 때문이다”(112쪽)라고 일갈한다. 뭔가 후련했다. 좋음과 나쁨의 전복이 아닌 규범의 용도 폐기.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니 배려도 필요치 않은 상태. 누가 결혼했든 이혼했든 합격했든 실직했든 발병했든 서툰 연극 배우처럼 구는 짓은 이제 그만이다.
나이 들면서 체지방이 늘 듯 안 쓰는 핸드폰 번호가 쌓인다. 번호는 정리해도 인연은 삭제되지 않고 내가 피해도 삶이 만나게 한다. 사는 동안 운명을 뒤바꿔놓을 결정적인 만남은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 신상 정보의 업데이트가 안 된 지인들과의 애매한 만남, 아니 마주침은 종종 일어날 것 같다.
“우리의 인생은 (…) 어릴 적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고, 협소하고, 단편적이다.”(116쪽)
이 단편적 만남, 하찮은 우연에 잘 임하고 싶다. 안색을 살피고 고요를 챙길 것. 앞으로 수 차례 결혼식과 장례식 그리고 무수한 대중교통의 탑승 기회가 남았다.
'은유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널예스 - 슬픔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0) | 2017.04.20 |
|---|---|
| 엄마의 노동은 일흔 넘어도 계속된다 (0) | 2017.04.12 |
| 레즈비언 부부와 놀다 (2) | 2017.03.27 |
| 친구 같은 엄마와 딸이라는 환상 (5) | 2017.03.22 |
| 시사인 - 그날의 눈은 나를 멈춰세웠다 (2) | 2017.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