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과 한 단어의 진정한 만남에 기회가 필요할 때도 있다. (…)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생에서 수많은 단어를 만나지만, 어떤 단어들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데 비해 어떤 단어는 평생을 함께 지내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37쪽).”
중국 문화대혁명 속에서 성장한 소설가 위화는 그 단어를 ‘인민’으로 꼽는다. 스물아홉 살에 작은 시위 현장을 목격하고 인민을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고백한다. 내게 그런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하니 ‘엄마’가 떠오른다. 부르기도 많이 불렀고 불리기도 제법 불렸다. 엄마에게 전적으로도 의탁했던 시기엔 공기처럼 망각했던 말. 출산을 한 뒤로 피부처럼 몸에 달라붙어버린 단어.

엄마라는 말은 익숙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냥 엄마’는 없기 때문이다. 임신에서 출발해 신생아 엄마, 돌쟁이 엄마, 유치원생 엄마, 중학교 2학년 엄마, 수험생 엄마, 실습생 엄마, 군인 엄마 등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엄마의 옷을 입고, 상황에 따라 비염에 걸린 아이 엄마, 가해자 엄마, 학급 모임에 안 나오는 엄마도 되어본다. 매번 낯설고 계속 헤맨다. 둘째 아이는 첫째와 기질이 다르니 양육 경험이 무용하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듯 같은 엄마를 두 번 사는 경우는 없다.
얼마 전 아들이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했다. ‘군인 엄마’는 가장 난해한 엄마 체험이었다. 입대 날짜 받아놓았을 때, 먼저 아이를 군에 보낸 선배가 말했다. “너, 글 쓸 거리 매일 생길 거다.” ‘글감이 많다는 건 풍파가 많다는 뜻인데….’ 무지는 불안을 조장했다. 아이가 신병훈련소에 있을 땐 날마다 육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편지를 썼다. 군부대 카페 게시판 클릭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소대 ‘밴드’에도 가입했다. 아, 구속이여. 군인 엄마로서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다가 ‘전쟁없는세상’이라는 단체에 가입해 후원금을 냈다. 여기저기서 정보를 챙기고 불안을 글로 달랬다.
어느덧 나는 아들이 휴가를 나와도 사발면 사놓고 외출하는 의연한 엄마가 되어갔다. 바로 그 무렵 휴가 나온 아들이 귀대하며 말했다. 어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만 3년을 교제했다. 여자친구는 나와는 아들 면회도 같이 갔던 사이니, 우리의 인연도 종료되는 셈이었다. 아들을 보내고 나는 자꾸 눈물이 흘러 애를 먹었다. 아들과 감정선이 연결된 느낌은 아이가 열이 날 때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과는 또 달랐다. 이것이 슬픔의 공동체인가. 그 경험은 나에게 엄마라는 말의 지평을 넓혀주었다. 군 복무 중 애인과 헤어진 아들의 엄마까지 해보자 엄마 레벨이 상승하는 것 같았다.
연이어 망각하고 배신하는 단어,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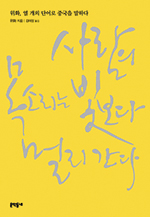
위화는 “한 개인의 운명을 결코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없었던 시대(124쪽)”를 통과했다. 유년 시절부터 소년 시절까지 사형수들이 총살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하고 밤마다 꿈속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쫓긴 이야기를 터놓으며 “정신이 허물어지는 아슬아슬한 가장자리를 걸어온 것 같다(156쪽)”라고 쓴다. 그가 추락하지 않고 살아낸 건 글쓰기의 힘이었다. “글쓰기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억압된 욕망과 감정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다. 나는 글쓰기가 사람의 심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더욱더 완전하게 만들어준다고 믿는다(147쪽).”
한 개인의 운명을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인 엄마. 날마다 나를 생초보로 리셋시키는 환장할 엄마 노릇이 아니었으면 글쓰기를 시작하지 않았을 거 같다. 뭐라도 쓴 덕에 몰락을 피했다. “가장 먼저 인식하고 쓴 단어였지만 살아가면서 연이어 망각하고 배신했던 단어(37쪽)”, 엄마를 오늘도 산다.
'은유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원더플 비혼, 너에겐 친구가 있잖아 (4) | 2018.04.16 |
|---|---|
| 우리가 한바탕 이별했을 때 (0) | 2018.04.08 |
| 웅크린 말들 - "원하는 돈 줄테니까 덮고 가자" (0) | 2018.03.18 |
| 여자들은 왜 늘 반성할까 (0) | 2018.03.15 |
| 딸 없으면 공감 못하나 (0) | 2018.03.11 |